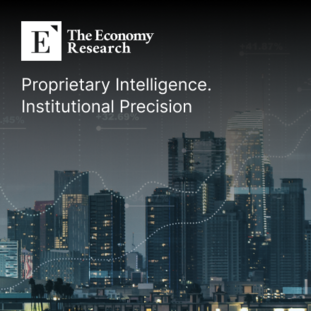지방 세컨드홈 특례 완화에도 시장 싸늘, 일본식 장기 침체 우려 커져
입력
수정
규제 완화에도 제도적 한계 뚜렷
지방 시장 침체 및 구조적 요인 가속
일본식 ‘집 안 사는 문화’ 확산 조짐

정부가 지방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시장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눈길을 끈다.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구조적 침체가 고착한 만큼 단기적 세제 혜택으로는 수요를 자극하기 역부족이란 평가다. 전문가들은 일찍이 ‘삼극화 현상’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할 경우 지방 주택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경고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쏠림 완화’ 위해 특례 대상 확대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정부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발표 이후에도 세컨드홈을 둘러싼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지역에 두 번째 집을 마련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위 ‘노른자’ 입지로 불리는 관광지라면 일부 고급 별장 수요가 발행하겠지만, 관광단지의 경우 분양형 주택 공급이 막힌 탓에 투자 대안으로도 매력이 떨어진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일관된 시각이다.
정부가 제시한 건설투자 보강 방안은 지방 부동산 침체와 미분양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6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2만6,716가구 중 83.5%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수요 환기책’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강원 강릉·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의 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제도의 혜택 범위를 넓혀 생활·방문 인구를 끌어들이고, 종국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혜택의 구체적 내용도 크게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만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준이 9억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취득세 감면 대상도 취득가액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늘었다.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 상당수가 혜택 범위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컨드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사들이 짓는 고급 빌라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대상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방 인프라 부족과 직장 기반 부재가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서울 주택을 사면 2주택자로 간주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역차별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순 세제 혜택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공급 허용이나 타임쉐어(Time Share, 하나의 부동산을 다수 주체가 소유하고 일정 기간씩 사용하는 방식) 제도 도입 같은 근본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부재-인구 감소-미분양 누적’ 악순환
장기간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도 세컨드홈 수요 위축의 주요 원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6월 셋째 주 기준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3% 하락하며 55주 연속 내림세를 그렸다. 광주(-0.06%), 부산·대구(-0.05%) 등 주요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데 따른 결과다. 거래량을 놓고 보더라도 1분기 비수도권에서는 6만4,670건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은 8,603건에서 1만7,325건으로 두 배 이상 늘며 대조를 이뤘다.
지방 부동산 침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다. 4월 기준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5만2,400가구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물량은 2만 가구를 넘어서며 1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동원해 매입에 나섰지만, 발표 직후 한 달간 신청만 3,536가구가 몰리며 공급 과잉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지역별 격차도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위도 37도’라는 표현이 회자될 정도로 집값 하락 선이 북상했다는 진단이다. 경기도 여주·이천·용인 등은 과거 고점 대비 30~40% 하락한 단지가 주를 이루는 반면, 수원 광교나 분당처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은 강남 집값 상승에 동반해 고점 회복세에 다가섰다. 결국 지방과 수도권,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뉘는 ‘삼중 구조’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침체가 점점 더 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축소는 지역 건설사와 금융권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인프라 투자 축소로 연결되면서 인구 이동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는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 인구가 1% 줄어들 경우, 같은 해 주택 매매가격이 0.1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인구 이동을 견인할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방 주택 시장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부동산 ‘투자·보유 회피’ 인식 확산 가능성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지방 침체가 심화하는 양상은 일본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수도를 비롯한 일부 핵심지 집값만 오르고, 지방은 장기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양극화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미분양 적체와 인구 유출, 금융 부담 확대는 이미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요자들은 지방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기를 꺼리는 식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이와 같은 흐름을 경험했다. 올해 상반기 도쿄 23구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1,632만 엔(약 10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 상승했다. 그러나 전체 시장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10~15%만이 상승·유지되고, 70%는 완만한 하락, 15~20%는 사실상 가치가 사라지는 ‘삼극화’가 뚜렷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레이와 버블(令和バブル)’이라 부르며 버블 경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진단한다. 전국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들끓던 과거와 달리, 특정 대도시와 일부 역세권만 살아남는 구조로 변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 사회에는 ‘집을 사지 않는 문화’가 깊숙이 자리잡았다. 버블 붕괴를 경험한 세대는 “부동산은 언젠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굳혔고, 상속세·재산세 부담을 이유로 지방 주택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지방 주택 7채 중 1채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으며, 농촌과 소도시는 병원·마트·교통망 같은 생활 인프라 붕괴로 실수요자들조차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가격 하락을 넘어 부동산 자산 선호 자체가 약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외국인 투자자와 일부 고소득층이 도쿄·요코하마·고베 같은 대도시의 고급 맨션을 매입하며 시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대다수 일본인은 부동산을 자산으로써 축적하려는 의지를 잃은 지 오래다. 결국 부동산은 투자나 보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모자라 ‘회피 대상’이 되는 문화적 대전환을 겪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지방 곳곳에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만큼 향후 상속이나 보유에 수반되는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지방 주택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인한 시사일본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궤적을 밟는다면 주택 자산에 대한 선호 자체가 약화되고, 장기 침체와 자산 양극화를 동시에 불러올 위험이 크다”면서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를 이끌 실질적 성장 동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 주택 시장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