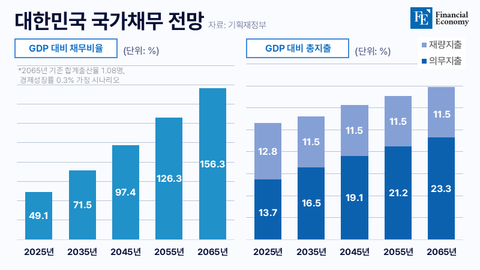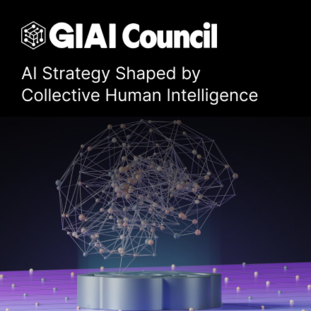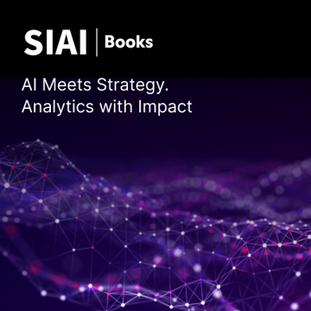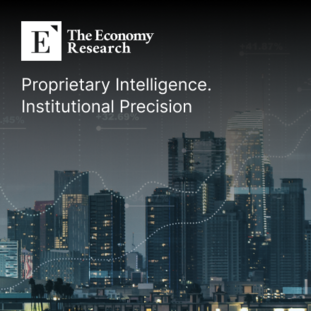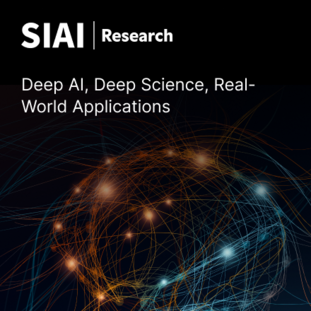“중국에 밀려 호흡기도 간당간당” 정부, PEF에 석유화학 구조조정 SOS
입력
수정
석유화학, 자율 구조조정 첫발 정부, PEF 참여 가능성 타진 PEF업계 "실행 가능성에 한계"

HD현대와 롯데그룹의 대산NCC 통합을 계기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자율 구조조정이 첫발을 뗀 가운데, 정부가 사모펀드(PEF)의 참여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적 투자자(FI)의 자본력과 운영 역량을 구조 혁신에 활용하려는 취지지만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과 과거 실패 사례, 먹튀 논란 우려 등으로 실행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비등한 분위기다.
'구조조정 1순위' 된 석화 산업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복수의 국내 PEF를 대상으로 석유화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운용사는 미국과 이탈리아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해 보고했으나, 국내 산업 환경과 정책적 제약을 고려할 때 실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 주를 이뤘다.
이번 논의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의 대산 NCC 설비 통합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본격화됐다. 석화업계는 지난 50년 동안 수출 호황을 누리며 국내 대표 기간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일찌감치 석화 자급률 100%를 목표로 삼았던 중국의 몸집 불리기에 맥없이 설 자리를 잃은 상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의 경우 중국의 자급률은 올해 기준 각각 85%, 100%에 이른다.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도 2020년 3,100만 톤에서 2028년 7,600만 톤 규모로 두 배 이상(14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으로선 최대 수출 시장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국내 석유화학 업체끼리의 통폐합은 선택지가 아닌 필수 답안지가 된 상황이다. 이번 대산NCC 통합은 사실상 업계의 첫 자율 구조조정 시도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5대 그룹 총수들이 만났을 때 두 기업 간 NCC 통합 시도를 언급하며 "석유화학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도 설비 통합 관련 논의가 물밑에서 활발히 오가는 분위기"라며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라고 귀띔했다.

공멸 위기 속 공장통합·사업재편 속도
실제 국내 대기업들은 비주력 사업 털기에 나서며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불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최근 롯데케미칼은 수처리 분리막 생산 공장을 매각했다. 이에 앞서 여러 나라에 있는 자회사 지분을 던지며 잇달아 자산을 판 결과 1조7,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내부적으로 대산에 이어 여수 지역 납사분해설비(NCC)에 대해서도 매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업계에서 정밀화학 사업 매각설 등 뜬소문도 돌았지만 큰 틀에서 범용 기초소재 부문부터 줄이겠다는 방향성은 유지되는 것이다. LG화학의 여수 NCC도 매각 예정 자산이며, 한화와 DL그룹 합작사인 여천NCC 역시 정리 고민이 한창이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대형 산단에서 앞다퉈 발을 빼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합작법인(JV) 형태 통합 등에 금융 지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경쟁력 제고까지 기대하긴 힘든 방식이란 지적이 많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공동지배하는 여천NCC처럼 양사 모두에 계륵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업 구조나 재무 사정, 체급이 서로 다른 그룹사가 맞손을 잡아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쉽지 않은 탓이다.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 시그널을 내기 시작했다면 이참에 털고 나갈 유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GIP-헤스, KKR-FL셀레니아 외엔 전부 실패
게다가 국책은행의 금융 지원 만으로는 산업 전반의 구조 혁신을 감당하기에 자본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해외에서는 수조원대 석유화학 자산을 대형 PEF가 성공적으로 인수·회수한 사례가 존재한다. 글로벌 인프라 전문 PEF인 GIP는 2014년 미국 헤스(Hess)의 백킨 셰일 지역 중류 자산 지분 50%를 26억7,500만 달러(약 3조7,00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2023년 미국 에너지기업 셰브론(Chevron)이 회사를 약 530억 달러(약 73조6,000억원)에 인수하면서, GIP는 9년간 3배 이상의 자본금을 회수하고 약 53억 달러의 차익을 실현했다.
앞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도 2005년 이탈리아 윤활유 회사 FL셀레니아를 약 9억8,0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에 인수, 2년 후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에 약 13억7,000만 달러(약 2조원)에 매각했다. 이는 단기간 내 뚜렷한 수익 실현과 구조개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럼에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이러한 모델을 단순히 적용하기엔 제약이 많다는 게 PEF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그간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귀결돼서다. 일례로 칼라일(Carlyle)은 2007년 인수한 석유회사 PQ Corp의 기업공개(IPO)를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2020년 회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TPG가 인수한 알레리스(Aleris)도 2009년 파산을 겪은 후 중국 자본에 매각됐는데, 이때 TPG는 8억3,000만 달러(약 1조1,500억원)의 손실을 봤다. 2023년에는 아폴로가 브라질 회사 브라스켐(Braskem)을 28억6,600만 달러(약 4조원)에 인수하려 했으나 각종 규제에 부딪혀 철회한 사례도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자본집약적 특성과 PEF의 단기 수익 추구 전략 간 구조적 불일치도 문제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초기 투자와 장기 회수 기간이 필요한 반면, 대부분의 PEF는 3~5년 내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목표로 한다. 성공 시 과실이 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내 PEF 한 관계자는 "산업 구조조정 명분으로 뛰어들었다가 성공적 엑시트를 해도 론스타 사례처럼 먹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국내 자본으로 투자해도 여론은 부정적일 수 있어 위험 대비 수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