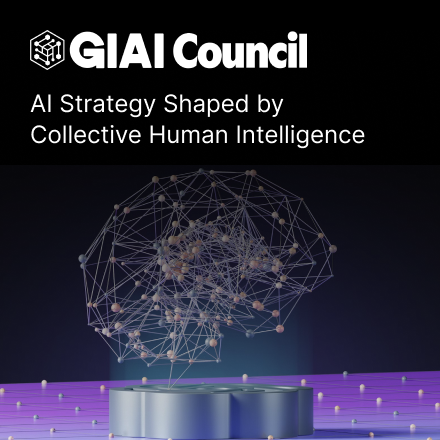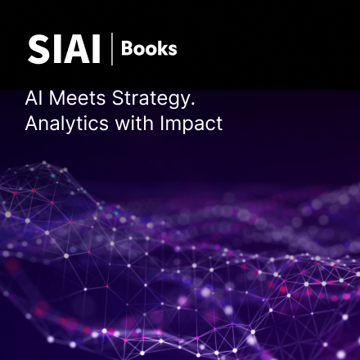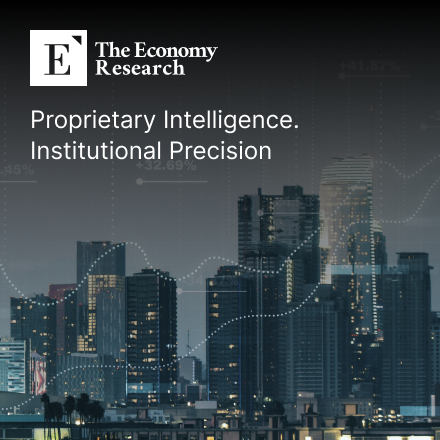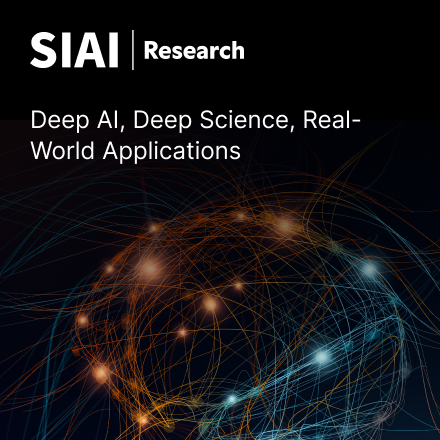입력
수정
전세사기 등 여파로 월세 선호도 뚜렷해져 서울·아파트보다 지방·非아파트 비중 커 수도권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월세 상승세

전국의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특히 지방에서는 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80%를 넘어서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세사기 여파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4년 새 월세 비중이 2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 월세 비중, 4년 만에 20%P 확대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로 집계됐다. 월세 비중이 6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신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월을 기준으로 2021년 41.7%를 기록한 뒤 2022년 47.1%, 2023년 55.2%, 지난해 57.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1월 기준 수도권의 경우 5.9%, 지방은 6.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세를 얼마 받을지 계산하는 비율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월세 비중은 60.2%로, 1년 새 3.1%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기간 지방은 5.4%포인트 늘어난 63.5%를 기록했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65.2%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월세 비중은 올해 1∼2월 44.2%로 1년 새 2%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이 43.8%, 지방은 45.4%다. 같은 기간 비파아트 월세 비중은 76.3%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증가했다. 지방 비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8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76.1%, 수도권 73.2% 순이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거래량도 따라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월세 거래량(13만1,939건)은 전월 대비 18.6%, 전년 동월 대비 12.6% 늘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9.7% 상승한 수치다. 반면 전세(8만6,032건)는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했고, 최근 5년 평균 대비 16.6% 줄었다. 월세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월세통합(준월세‧준전세 포함) 가격지수는 102.94로 17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 소형 아파트(40㎡ 이하) 월세가격지수는 2023년 12월 103.57에서 2024년 12월 106.79로 3.22% 상승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에 '월세화' 가속
월세 비중이 급증한 것은 지난 2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 전세기피 현상의 여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세 사기 피해액은 9조원, 피해자는 4만 명에 달한다. 1인 가구 증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 주식·코인 등 청년층의 금융자산 투자 선호 등도 월세화를 가속하는 요인이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월세화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었고 기준금리가 인하하며 은행 예금금리가 떨어지자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월세 거래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 1월10일부터 24일까지 부동산 전문가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크게 증가'는 9%, '소폭 증가'는 69%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2024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4%,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임차인의 월세 거래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우려 36% △높은 전세가격에 따른 자금 마련 부담 30% △전세자금 대출 규제·전세보증가입 요건 강화 22% △자산을 투자 자금으로 활용 선호 12% 등의 순이었다. '임대인의 월세 거래 증가 요인'으로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 확보와 수익률 제고 41% △임대 수익 목적의 주택 매수 증가 25% △계약 만기 후 전세금 반환 부담 경감 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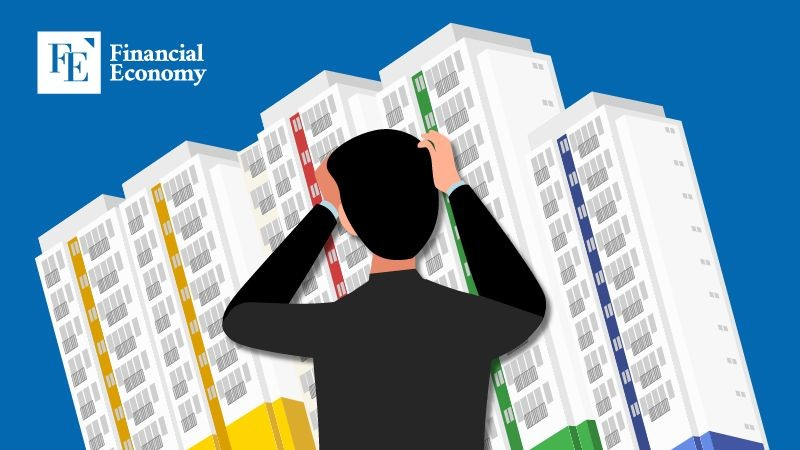
대학생·회사원 주거비 부담 확대 우려
다만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면서 자취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서울 주요 대학 인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60만9,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조사 때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2,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월세와 관리비가 각각 6.1%, 8.1% 오른 셈이다.
대학가별로 보면 성균관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지난해 1월 47만원에서 올해 1월 62만5,000원으로 1년 새 33%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중앙대 인근 지역이 같은 기간 48만원에서 52만7,000원으로 9.8% 뛰었으며, 연세대 인근은 60만원에서 64만3,000원으로 7.2%, 한국외국어대 인근은 59만원에서 63만1,000원으로 6.9%, 고려대 인근은 57만원에서 60만4,000원으로 6% 올랐다.
월세에 대한 부담은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는 전월 대비 0.15% 상승해 18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도 지난해 11월에 비해 0.12% 오르며 2024년 1월 상승 전환한 후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지난해 11월(0.09%)보다 확대됐다. 아파트 월세 역시 오름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임대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월세 세입자 10명 중 4명가량은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내는 것으로 조사돼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