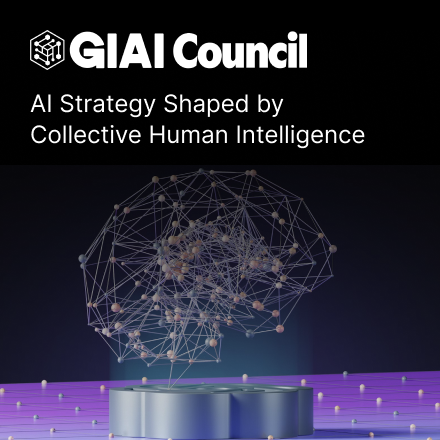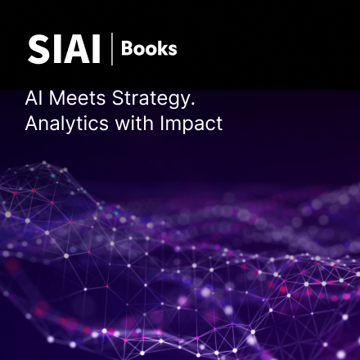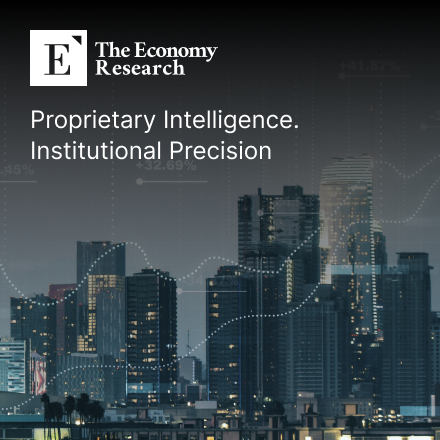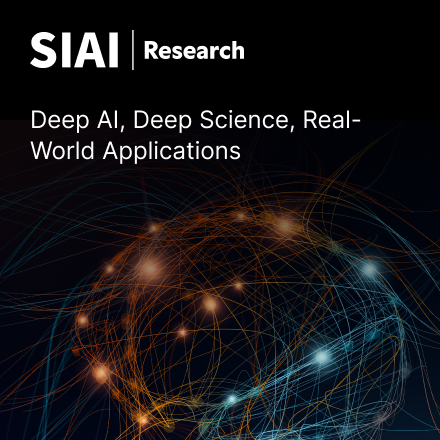입력
수정
10대 금융지주 순이익 1년 사이 10.8%↑ 역대급 실적에도 자산건전성은 ‘빨간불’ 보통주 자본비율 낮아지며 관리에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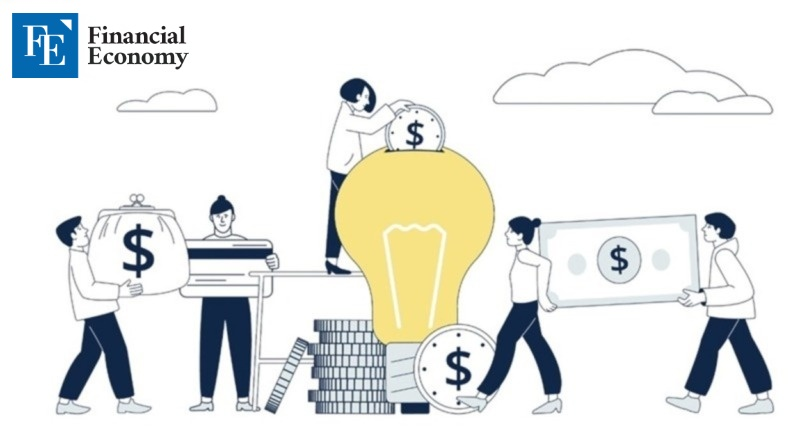
지난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가 24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새로 썼다. 은행을 비롯해 보험, 금융투자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이 같은 호실적을 이끌었지만, 대부분 금융기관은 여전히 자산건전성에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부실화 우려가 큰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은행 이익 비중 59.8% 달해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내 10대 금융지주사(KB·신한·농협·하나·우리·BNK·DGB·JB·한투·메리츠)의 합산 순이익은 23조8,4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21조5,246억원)과 비교해 2조3,232억원(10.8%) 증가한 수준이다.
업권별 이익 비중은 은행이 59.8%(16조3,000억원)로 가장 컸으며, 이어 보험 14.3%(3조9,000억원), 금융투자 11.7%(3조2,000억원), 저축은행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9.4%(2조6,000억원) 등 순을 보였다. 이익 증가 규모 또한 은행이 9,628억원(5.4%)으로 가장 컸고, 보험 5,516억원(16.5%), 금융투자 4,225억원(15.2%) 등이 뒤를 이었다. 여전사는 유일하게 1,591억원(5.8%)의 감소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지주사 실적에 대해 “자본 적정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양호하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금융 시장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금융지주의 잠재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 및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PL-요주의여신 나란히 증가세
역대급 실적에도 금융당국이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강조한 것은 주요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KB·신한·하나·우리·NH·IBK 등 주요 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은 9조7,864억원으로 2023년 말(7조6,849억원)과 비교해 2조1,015억원 증가했다. 은행은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이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을 묶어 NPL로 부른다. NPL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는 악화한다.
NPL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매년 낮아지다 2023년 증가세로 전환했다. 팬데믹 시기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 정부의 대대적인 금융 지원이 있었던 것과 달리 2023년부터는 이 같은 효과가 사라진 탓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경기 불황에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연체가 폭증했다는 게 금융권의 일관된 목소리다.
더 큰 문제는 NPL로 분류되기 직전 상태의 요주의여신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3조원가량이었던 6대 은행 요주의여신은 지난해 약 14조원으로 증가했다. 통상 1~90일 동안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잠재 부실 채권을 의미하는 요주의여신은 고정이하여신이 급증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까지 증가하면서 올해 건전성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다”면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팬데믹 당시 시행했던 금융 지원 정책 효과로 억눌러놨던 게 지난해부터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대출 자산 건전성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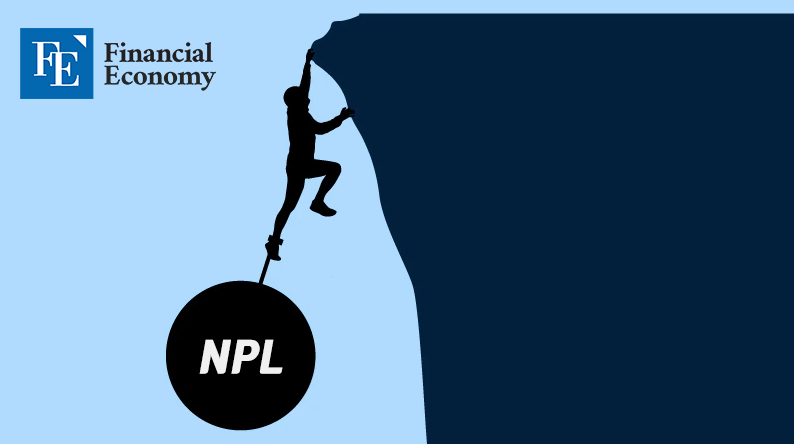
연체율 관리 시급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 축소 움직임
업계에서는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위험 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가운데 위험가중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그 규모가 234조4,358억원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221조5,659억원), 하나은행(201조4,392억원), 우리은행(192조87억원), NH농협은행(146조175억원)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위험가중자산에 따라 은행의 대표적인 자본 적정성 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CET1)’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CET1을 산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커질수록 CET1이 낮아지는 구조다. 국내 은행의 CET1은 지난해 3분기 13.34%에서 4분기 13.07%로 악화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기조도 은행권에 부담 요인이다. 당국은 지난해 9월 스트레스 완충자본규제 도입을 예고하며 은행 및 금융지주가 충족해야 할 CET1 기준을 9%에서 11.5%로 높였다.
이에 은행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축소에 돌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2조1,000억원 줄어들며 올해 1월(7조8,000억원)과 2월(3조5,000억원)의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1조4,000억원 줄어들며 대기업 대출 감소(7,000억원)의 두 배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은행들이 기업대출 부문 중에서도 건전성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실화 우려가 큰 중소기업 대출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봤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당국의 건전성 관리 압박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에는 은행들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