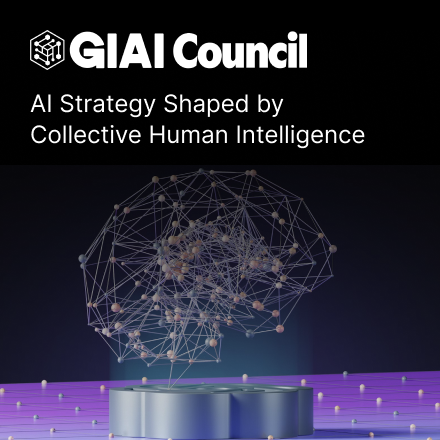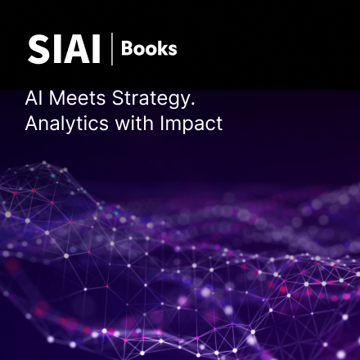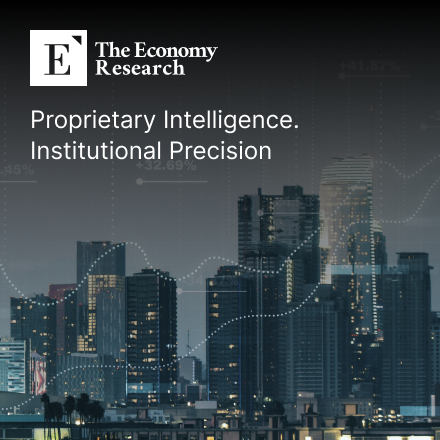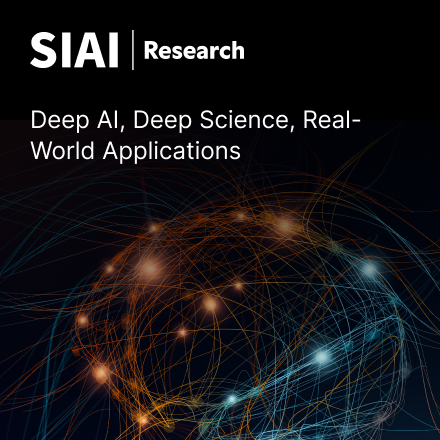입력
수정
'적자 늪' 빠진 상호금융 부동산 급등기에 PF 늘려 덩치 불어도 관리는 느슨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의 지난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2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6배 급증한 규모다. 지역·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한눈을 판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위기 때보다 적자폭 커
2일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신협과 수협은 지난해 각각 3,419억원, 2,725억원 순손실을 냈다. 1960년 설립된 신협은 2002~2023년 22년 연속 흑자 기록을 세웠으나 지난해 적자 전환했다. 수협 역시 1962년 창립 이후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과거 외환위기 여파가 미친 1999~2001년보다 적자 폭이 크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의 적자를 합하면 2조3,526억원에 달한다.
전국 상호금융 단위조합 2,164곳의 부실 채권 규모도 상당하다. 금감원의 금융통계를 보면 이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7조3,517억원으로, 2023년 말 17조3,535억원 대비 57.6% 급증했다. PF 부실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9조1,339억원)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고정이하여신비율)도 5.26%로 전년(3.41%) 대비 1.85%포인트 뛰었다. 전체 대출 중 5%는 회수가 쉽지 않은 채권이라는 의미로,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부실률이다. 수협(7.20%), 신협(7.08%), 산림조합(6.58%), 농협(4.53%) 등 개별 조합들도 모두 최고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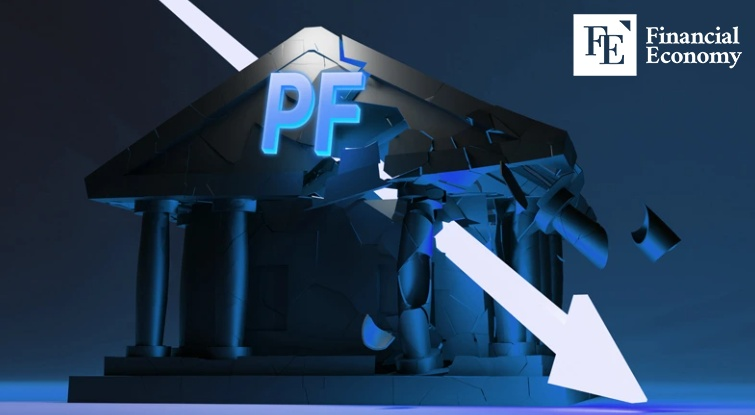
'회수 불능' 부실채권 7,000억 돌파
상호금융권이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낸 것은 부동산 PF 부실이 확대돼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았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은 대출 회수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 미리 마련해 두는 일종의 준비금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고, 신협과 수협은 지난해 각각 충당금 약 6,500억원, 800억원을 쌓았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이 저금리 시기에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하며 부실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치솟으며 사업성이 악화한 PF 대출이 대규모 연체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상호금융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54조6,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216조5,000억원)의 4분의 1에 이른다. 일련의 부실채권 등은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며 4대 상호금융의 3분의 1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상호금융 지역 조합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 중 회수를 포기한 금액도 7,704억원6,500만원으로, 전년 동기(5,722억3,400만원) 대비 35%가량 늘었다.
상호금융이 기업대출을 늘리게 된 배경은 불어난 자산 규모에서 찾을 수 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고 높은 수익률로 회수할 수 있는 기업대출에 관심을 쏟은 것이다. 하지만 애초 상호금융은 조합원의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기업대출 위험성을 따질 만한 전문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 실제 같은 농·수협 이름을 공유하지만 NH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 미만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리스크를 검토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 대출 열풍에 편승한 것”이라며 “다른 금융기관 대비 PF 부실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관리·감독 안돼 부실 눈덩이
더 큰 문제는 개별 단위조합의 감독 체계가 미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실을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4대 상호금융 단위조합 중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조합은 2019년 말 89개에서 지난해 6월 말 163개로 83.1% 늘었다. 자산 규모는 커졌으나 상호금융 단위조합에 대한 내부통제와 이를 강제할 법적 규제는 비슷한 자산 규모를 갖춘 다른 금융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79개 중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곳이 31개에 불과하지만,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2027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반면 상호금융은 저축은행과 달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위조합과 금고가 감사,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의무에서 자유로운 이유다. 관리·감독 주체인 주무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통제도 어렵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부통제 장치가 미비한 상호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효율적 부실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단위조합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