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루피화 사상 최저치 하락, 트럼프 관세에 흔들리는 모디노믹스
입력
수정
트럼프 징벌적 관세로 외국인 자본 이탈 올 들어 증시도 급락, 시총 1조 달러 증발 대미 무역 협상이 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두고 미국과의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징벌적 고율 관세가 루피화 가치를 끌어내리며 달러 대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인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 전반에서 빠르게 이탈한 것이 루피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경제성장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도의 핵심 경제 전략인 '모디노믹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둘러싸고 美·印 갈등
15일(현지 시각) 닛케이 아시아는 "루피화가 지난 11일 달러당 88.491루피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초부터 이어진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루피화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루피·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흐름에 글로벌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88.00루피까지 하락했다. 지난 1일에도 장 중 한때 88.33루피까지 떨어지며 최저점을 찍었지만, 인도중앙은행(RBI)이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서면서 88.19로 마감한 바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의 배경으로는 대미 무역 갈등이 꼽힌다. 러시아안 원유 수입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징벌적 관세가 불확실성을 키워 성장에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가 루피화의 가치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부과한 대인도 관세율은 50%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유럽국에도 인도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는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양측은 지난달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징벌적 관세는 양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긴밀한 관계를 뒤엎는 조치”라며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외환시장의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올 들어 루피화의 수익률은 아시아 통화 가운데 가장 나쁘다"고 짚었다.

印 주가 하락에 국내 상장 EFT 손실 확대
인도 자본시장의 불안은 증시에서도 확인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한 지난 3월 인도 주식시장은 약세장으로 진입했다. 인도 증시의 양대 대표 지수인 니프티50(Nifty 50)과 선섹스(SENSEX)는 지난해 9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면서 각각 14% 하락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조 달러가 증발했다. 중·소형주 중심의 스몰 캡과 미들 캡 지수는 20% 이상 떨어지며 약세장을 형성했다. 8월 들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증시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도 증시의 약세가 장기화하는 사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인도 상장지수펀드(ETF)들은 올해 들어 대부분 손실을 나타냈다. 이들 상당수가 인도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했던 2023년에 상장돼 높은 기대를 모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달 기준 국내 상장 인도 ETF 12종 중 2종만 보합권을 유지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인도 니프티50 ETF의 경우, 최근 6개월 기준 수익률이 –2.01%에 그쳤다. 3개월 기준으로는 -3.69%, 최근 1개월 기준은 –4.84%다.
인도 ETF 부진은 다른 아시아 증시가 고공행진 중이라는 점에서 한층 대비된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과 홍콩 관련 ETF는 총 44종으로, 최근 1개월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2종뿐이다. 일본 증시 ETF는 반도체 집중투자 ETF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익을 내고 있다. 도쿄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KODEX 일본TOPIX100 ETF의 경우 지난 한 달간 7.18%나 급등했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의 ETF인 ACE 베트남VN30(합성) ETF는 최근 1개월 수익률이 15.05%, 3개월 수익률이 26.57%에 달한다.
4년 만에 최저 성장률, 체질 개선 필요해
일각에서는 경기선행지수인 증시 침체가 모디노믹스의 둔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총선 승리로 출범한 모디 정부 3기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 금융·세제 개혁 등을 촉진할 핵심 정책을 내세웠지만,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변화, 경제 성장 둔화라는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정책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높은 인플레이션, 소비 위축, 실업률 상승, 빈부 격차 심화 등이 겹치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인도 경제는 4년 만의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9.2%)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2021 회계연도(-5.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모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연 8%대 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지난해 인도 경제의 둔화 배경으로 제조업 부진, 긴축적 통화정책,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비심리 위축 등을 꼽았다.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샘 조킴 EFG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는 2025∼2026 회계연도에도 6.5%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라며 "모디 정부가 섬유, 신발 등 취약 업종을 지원하고 소비세 개편을 포함한 개혁을 추진해 경기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는 했지만, 결국 미국과 협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느냐가 향후 인도 경제의 핵심 변수"라고 밝혔다. 시티그룹도 이번 관세가 인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6~0.8%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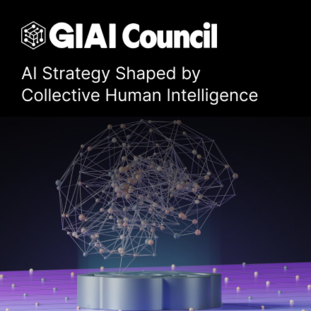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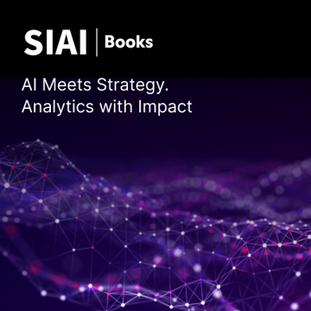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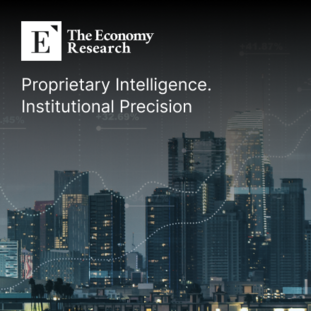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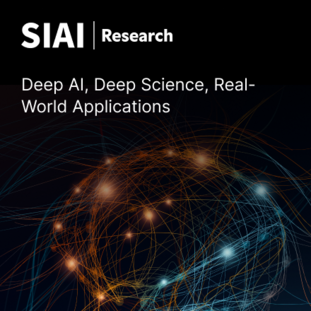
Comment